버스(Bus)란?
마스터 섹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는데, 바로 버스(Bus)라는 것이다. 앞서 오디오 믹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언급한 바 있기도 하며, 오디오 믹서를 다루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는 개념이다.
일단, 버스(bus)라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여러 사람을 태워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는 대중교통수단을 뜻한다. 전자공학과 음향 분야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여러 신호를 한데 묶어 특정 목적지로 전달하는 통로를 의미하게 되었다. PC 조립에서 보게 되는 PCI-Express 버스나 메모리 버스도 모두 같은 의미이다. 즉, 버스란 ‘여러 신호의 묶음 또는 다발이 지나가는 길’이다.

오디오 믹서에 대해 처음 이야기 하면서, 오디오 믹서의 역할은 소리를 받아서 하나로 만들어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라 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곳’을 향하는 길이 바로 버스이다.
아날로그 믹서 시절의 버스
아날로그 콘솔에서는 버스의 종류가 매우 직관적으로 나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메인 믹스(L/R), 여러 개의 ‘그룹(Group)’ 버스, 그리고 모니터나 외부 이펙트로 보내기 위한 ‘AUX(억스)’ 버스가 있다. 각 채널 스트립에는 이 신호를 어느 버스로 보낼 것인지를 선택하는 스위치나 노브가 달려 있었고, 엔지니어는 이를 조합해 무대, 모니터, 녹음기, 방송 송출 등 다양한 경로로 필요한 신호를 나눠 보낼 수 있었다.
디지털 믹서 시대의 버스
디지털 믹서로 넘어오면서 물리적 제약이 사라지자 버스의 개념은 더 유연해졌다. AUX, FX, Group, Matrix 등 용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Mix Bus’라는 하나의 통합적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다. 같은 버스라도 목적에 따라 ‘모니터 버스’, ‘이펙트 버스’, ‘그룹 버스’로 이름만 달리 사용할 뿐이다. 즉, 디지털에서는 버스의 개념이 더 크게 확장되고, 자유도가 높아졌을 뿐 근본 원리는 아날로그 시절과 완전히 동일하다.
버스는 결국 “신호가 지나가는 통로”라는 단순한 개념이다. 아날로그 콘솔의 그룹, AUX, 메인 믹스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 디지털 믹서의 신호 흐름을 이해하는 것 역시 매우 수월해 진다. 때문에 마스터 섹션을 깊이 이해하려면 버스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디오 믹서의 마스터 섹션(Master Section)
믹싱콘솔의 마스터섹션은 믹서의 전체적인 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각 채널에서 원하는 출력(즉, 원하는 버스)으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들은 각 출력의 마스터로 모이게 되며, 마스터 섹션의 최종 조정을 거쳐 믹서의 각 아웃 단자를 통해해 출력 되게 된다.
시작하기 전, 앞의 2회에 걸쳐 눈에 질리도록 봤던 그림들을 다시 가지고 왔다.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보시라.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 글을 읽기에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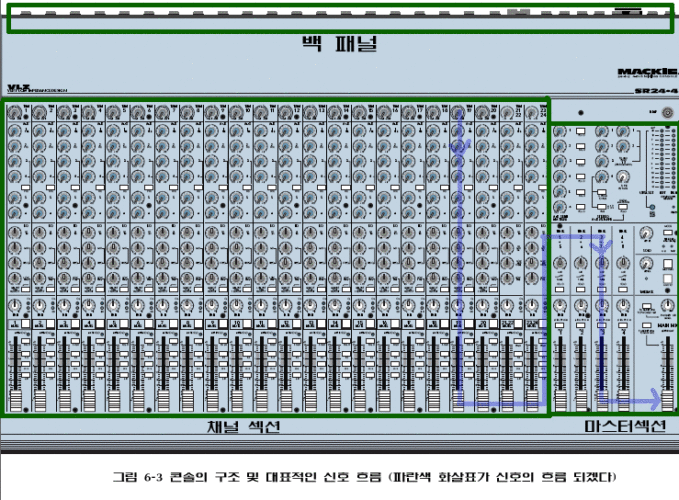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으나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 그림에서 파란색 경로는 채널 섹션에서 출발한 오디오 신호가 그룹을 거쳐 믹서의 최종 출력인 Main Mix에 도달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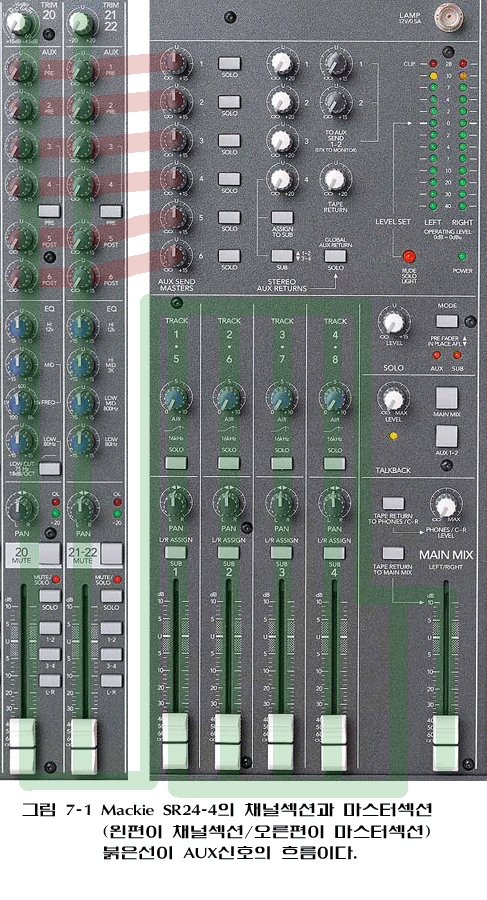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은 각 채널의 AUX 신호가 AUX 마스터로 향하는 경로와, 각 채널의 신호가 각 그룹 그리고 Main Mix로 향하는 경로를 나타낸다.
AUX SEND MASTERS
마스터 섹션의 상단에 보면 AUX SEND MASTERS라고 쓰여 있는 6개의 붉은 놉(Knob)이 보인다. 이곳은 각 채널의 AUX1~AUX6 신호가 모이는 곳이다. 채널 섹션에서 각 채널에 존재하는 AUX 놉이 해당 채널의 소리를 AUX 마스터로 얼마나 보낼 것인지를 결정했다면, AUX 마스터는 그 모아진 신호를 얼마나 크게 출력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6회에서 백패널을 설명할 때 AUX SEND라는 단자들이 있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AUX SEND의 레벨을 결정하면, 그 신호가 백패널에 있는 해당 AUX의 AUX SEND 단자를 통해 출력된다.
또한 각 억스마스터 놉 옆에 보면 SOLO라는 스위치가 붙어있다. 채널색션의 SOLO스위치가 각 채널 하나만의 소리를 들려주었듯이, 이 솔로 스위치를 누르면 해당 AUX MASTER를 통해 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UX1의 솔로를 눌렀을 경우 헤드폰을 통해 AUX1을 통해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AUX2를 누를 경우 AUX2를 통해 나가는 소리가 헤드폰으로 들리게 된다.
보통 고가의 콘솔로 올라갈수록 AUX의 개수는 증가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놀고 있는 SR24-4는 6개를 지원하지만, 좀 더 대형 콘솔로 올라가면 AUX가 12개나 달린 녀석도 있고, 모니터용으로는 20개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쓰이길래 이렇게 많은 AUX가 필요한 것일까?
AUX는 엔지니어에게 많은 융통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평범한 밴드 공연을 생각해 보자. 연주자와 보컬들에게는 당연히 모니터가 필요할 것이다. 드럼의 경우에는 자신이 치는 드럼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릴 것이고, 키보드를 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다. 보컬의 경우도 반주를 듣고 박자를 따라가거나 세션들과 합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각 파트별로 모니터에 필요한 소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 드러머가 듣는 모니터에는 신디사이저와 보컬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또한 신디사이저의 경우, 보컬과 베이스나 기타의 소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연주하고 있는 악기의 소리일 것이다. 다른 소리는 좀 작아도 자신의 소리가 확실히 들려야 할 것이다. 베이스 주자의 경우에는 보통 베이스 앰프에 연결해서 연주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리는 충분히 모니터가 되지만, 드럼이나 기타, 악기의 소리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각 섹션별, 연주자별로 모니터에서 원하는 소리가 다 달라진다. (물론 이것은 예시일 뿐이다. 본 필자는 연주할 때 보컬을 포함한 모든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결국 사람 by 사람)
드러머에게 AUX1, 신디사이저에게 AUX2, 베이스 기타 쪽에 AUX3, 보컬에게 AUX4를 각각 모니터로 할당 해 준다면 각각 연주자가 원하는 소리를 들려줄 수 있게 된다. 모니터뿐만 아니라, 서브 보컬들의 마이크가 있다고 치자. 거기에 나중에 설명할 리버브나 코러스 같은 효과를 살짝 얹어주면 훨씬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장비들을 ‘이펙터’라고 한다.) 하지만 각 채널만큼의 이펙터를 구입해서 인서트 단자를 통해 연결하는 것은 돈도 돈일뿐더러, 수많은 기기들을 조작하기에 엔지니어가 엄청 힘들어진다. 이때 보컬 채널에서 AUX로 뽑은 소리를 이펙터에 집어넣어 받는다면, 오퍼레이터는 AUX의 조절만으로 이펙터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하나의 이펙터가 입력받는 모든 채널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단 모니터와 이펙터뿐만 아니라, AUX에서 나오는 신호를 녹음할 수 도 있고, 부속 스피커가 있으면 그곳에 신호를 넘길 수 도 있고, 기타 등등… 콘솔의 출력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소리를 넘겨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이 AUX 되겠다.
RETURN MASTERS
AUX 마스터와 같은 칸의 오른편을 보면 흰색 놉 5개와 검은색 놉 2개, 그리고 몇 개의 스위치가 보일 것이다. 이곳은 리턴 마스터부이다. 이곳은 콘솔의 또 다른 입력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곳을 통해 입력을 받을 일은 거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이곳으로 입력을 받으면 레벨의 조절이외에는 전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단지 볼륨과 어사인 버튼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때문에 보통 이곳 대신에 여유 있는 모노 채널이나 스테레오 채널로 입력받게 된다. 하지만 알아두면 채널이 모자랄 경우 써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 소개니까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Tape Return
먼저 홀로 있는 하얀색 놉을 살펴보자. 여기에는 TAPE RETURN이라고 쓰여 있다. 백패널에 달려 있던 TAPE IN 이라 쓰여진 RCA 단자의 볼륨이다. 백패널의 테이프 인 단자에서 들어온 신호는 테이프 리턴 놉을 거쳐 메인 믹스나 헤드폰으로 출력시킬 수 있다. 오로지 입력 레벨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자이다. 출력 어사인은 마스터 페이더 옆에서 해준다. 좀 읽다 보면 나올 것이다.
TO AUX SEND와 AUX RETURN
그다음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AUX 리턴 단자 4개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TO AUX SEND에 대해서 알아보자. SR24-4에서는 총 4개의 스테레오 AUX 리턴을 제공한다. 앞서 AUX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AUX를 이펙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각 AUX를 통해 나갔던 신호를 다시 믹서로 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단자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일반적으로 이 단자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채널을 할당해서 사용하게 된다. 백패널에 보면 스테레오 AUX 리턴이라고 해서 4쌍의 TRS 단자가 있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곳을 통해 입력받은 신호에 대한 볼륨이다. 물론 LEFT/MONO만 연결하면 모노로 동작한다. 1, 2, 3은 메인 믹스로 어사인이 고정되어 있으며, 4의 경우 선으로 연결된 ASSIGN TO SUB와 SUB12,34 스위치를 통해 메인 믹스 또는 서브 그룹으로 보낼수 있게 되어 있다.
AUX 리턴 단자 1, 2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 바로 오른편에 같이 붙어 있는 TO AUX SEND와 연계되어 동작한다는 점이다. 만약 보컬 모니터를 AUX1, 2를 사용하고 AUX 리턴 1, 2를 이용해 이펙터에서 처리된 신호를 받는다면, AUX RETURN1, 2를 통해 들어온 신호를 AUX1, 2에 함께 보낼수 있다는 얘기다. 잘 이해가 안 가지? 채널 섹션의 AUX1~6까지의 레버를 기억하는가?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 백패널에 있는 AUX SEND 단자에서 들어온 신호를 AUX1과 AUX2로 보내는 볼륨이다. AUX로 보내는 스위치만 달랑 하나 달린 싱글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GLOBAL AUX RETURN / SOLO
마지막으로 GLOBAL AUX RETURN / SOLO라는 스위치가 있다. 이 녀석은 억스 리턴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전부 모니터 하는 스위치이다. 각 채널이나 억스센드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채널의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녀석을 누르면 헤드폰으로 억스리턴 1~4의 신호가 한꺼번에 들리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 놓았다는 것은, 제조사도 별로 쓸 일이 없을거란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소리다)
음량 이외에는 조절할 수 있는게 거의 없으며, 라우팅 (신호의 목적지)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번 얘기 하긴 했지만, 믹서로 들어오는 입력은 각 채널 입력을 통해 받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다.
GROUP MASTER
아래로 내려가 보면 그룹 마스터 섹션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까지 보던 것과는 다른 표시가 하나 되어 있다. TRACK1, 2, 3, 4는 대충 뭔지 예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생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TRACK5~8까지의 표시가 떡하니 붙어 있다… 이것은 멀티트랙 레코더를 운용할 때 필요한 것이다. 그룹 하나를 한 트랙에 녹음하는데, 왠지 한 채널에 한 트랙만 녹음하면 불안하잖아… 그래서 그룹 하나를 두 트랙에 녹음하기 위한 거다. 실제로 그룹 1과 그룹 5, 2와 6, 3과 7, 4와 8은 동일한 소리가 나온다. 그러므로 5, 6, 7, 8은 무시해도 된다.
믹싱콘솔의 GROUP
실제적인 그룹 섹션 조작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그룹(Group)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AUX와 마찬가지로 그룹 역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드럼의 예를 들어보자. 드럼에 마이킹을 할 경우, 아무리 대충 하더라도 최소한 3개의 마이크가 필요하다. 그런데 공연 도중 드럼 소리가 너무 크다거나 작다거나 해서 드럼 소리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싶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드럼에 연결된 채널을 하나하나 똑같은 양만큼 줄이는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현장에서 원래의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만큼 줄이거나 키우는 건 사실 쉽지 않다. (기보다는 귀찮…) 이때 써먹으면 잘 써먹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것이 그룹이다.
예를 들어 드럼의 3개의 마이크를 그룹 1로 지정했다고 하자. 그럴 경우 채널 섹션에서 그룹 1로 어사인을 해두었으니, 그룹 1의 크기만 조절하면 각각의 마이크 밸런스는 유지한 상태에서 드럼의 전반적인 음량 조정이 가능하다. 그룹이란 몇 개의 채널을 오퍼레이터 임의대로 묶어놓은 채널의 다발을 의미한다. 맥키 SR24-4에는 채널 섹션의 어사인과 마스터 섹션의 그룹 섹션에서 보았듯이 4개의 그룹이 존재한다. 그런데 채널 섹션의 어사인 스위치는 1-2, 3-4, 그리고 L-R 이 세 개의 스위치밖에 없다. 아무리 잘 생각해보더라도 그룹 어사인 스위치가 2개가 모자란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잠깐 생각을 돌려 채널 섹션에서 봤던 팬(PAN) 놉을 떠올려 보자. 팬 놉은 그 음원을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가운데로 보내서 균형을 맞춰주는 스위치라고 했다. 만약 이 스위치를 왼쪽으로 끝까지 돌린다고 생각해 보자. 그럴 경우 그 채널의 소리는 왼쪽으로만 나가겠지? 당연히 LEFT 채널에는 신호가 출력돼도, RIGHT로는 출력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어사인을 L/R에 눌렀을 경우 당연히 L로만 소리가 나가겠지?
그럼 거기에 살짝 짱구를 굴려서 1/2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룹 1로만 소리가 나가게 되고, 팬을 중앙에 두었을 경우 1과 2 동일하게 소리가 나갈 것이며, 팬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렸을 경우? 그룹 2로 소리가 나가게 된다. 이것이 채널 색션에서 채널을 그룹핑 해주는 방법이다. 즉, 실제로는 모노그룹 4개가 존재하고, 그 둘을 묶어 스테레오 그룹이 2개가 존재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룹 3,4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룹핑 해줄 수 있다.
AIR
어쨌든 채널 섹션에서 지정된 그룹으로 넘어온 소리들은 먼저 AIR라는 놉을 만나게 된다. AIR란 놉은 맥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놉인데,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스위치는 아니고 16kHz의 셸빙 이퀄라이저이다. 올리면 소리를 날리는 듯한 효과를 준다나 어쨌다나… 필자는 거의 써본 적 없다.
GROUP SOLO
AIR 아래를 보면 SOLO라는 스위치가 있다. 이것은 그 그룹에 대한 SOLO 스위치이다. SOLO에 대한 것이야 뭐 다들 알 테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GROUP PAN과 L/R ASSIGN
그 아래로 내려가면 PAN 놉과 L/R ASSIGN 스위치가 있다. 페이더가 뭐 하는 건지는 이제 아마 알 것이다. 이 그룹의 최종 출력 레벨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다. 그 위에 있는 L/R ASSIGN 버튼이 있다. 이 녀석을 누르면 페이더를 거친 신호가 메인 믹스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단지 백패널의 SUB GROUP OUTPUT으로 나가게 될 뿐이다.
그 위에 생뚱맞게도 팬이 하나 붙어 있는데, L/R ASSIGN을 누르지 않을 때는 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메인 어사인을 눌렀을 경우 이 녀석의 활약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SUB GROUP1의 신호를 메인 믹스의 어느 곳으로 보낼지 결정하는 스위치이다. 당연히 그룹 1이 모노라고 한다면 중앙에 두면 된다. 그럼 메인 믹스의 중앙으로 소리가 출력되게 된다. 만약 그룹 1-2를 묶어서 스테레오 그룹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그룹 1의 PAN은 LEFT, 그룹 2의 PAN은 RIGHT로 해두면? 오!!! 그렇다. 한 개의 스테레오 그룹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때문에 대부분 4버스 콘솔은 스테레오 2버스 콘솔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SOLO 섹션
솔로 섹션은 아주 단출하게 꾸며져 있다. LEVEL 놉 하나와 MODE 스위치 하나, 그리고 두 개의 LED…
먼저 MODE 스위치의 역할을 알아보자. 누르면 IN PLACE AFL, 빼면 PRE FADER라고 쓰여 있다. 이제까지 콘솔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여기저기에 SOLO 스위치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 채널만의 소리를 모니터하는 데 사용하는 스위치라고 했다. 여기는 그 SOLO의 동작 방법을 결정해 주는 곳인데, 이 스위치로 PRE FADER와 AFL을 결정해 줄 수 있다.
앞서 Pre Fader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한 바 있다. 페이더를 거치지 않은 신호, 즉 입력되는 신호 그대로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Pre Fader Listen의 앞자를 따 PFL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IN PLACE AFL이란 건 페이더를 거친 신호를 의미한다. AFL은 After Fader Listen의 약자로, 페이더를 거친 신호, 즉 실제 공간(PLACE)으로 출력되는 신호를 의미한다. PFL은 입력 레벨을 맞추는 데, AFL은 믹싱 밸런스를 확인할 때 사용하면 된다.
왼편에 있는 레벨 놉은 솔로 레벨을 결정하는 놉으로, 기본 유니티(U)에 놓고 사용하면 된다. 그 아래 있는 AUX와 SUB LED는 각각 AUX의 솔로를 눌렀을 때와 SUB GROUP의 솔로를 눌렀을 때 점등된다.
그 외의 마스터 섹션 구성요소
- TALKBACK
6회에서 토크백이 뭐 하는 녀석인지 말한 바 있다. 오퍼레이터와 무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얘기했었다. 토크백 레벨은 토크백 마이크의 음량을 조절하는 녀석이다. 그 왼편에 보면 MAIN MIX와 AUX1-2 두 버튼이 달려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곳으로 토크백 마이크의 신호를 보낸다. 이 두 버튼 중 아무거나 하나를 누르면 레벨 조정 놉 아래에 있는 노란색 LED가 점등되는데, 이는 토크백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 MAIN MIX
메인 믹스의 페이더는 이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각 채널에서 바로 L-R로 어사인해 들어온 신호나 그룹에서 L-R로 들어온 신호들의 전체 출력을 조절해 주는 메인 볼륨이다. 그 위에 달려 있는 PHONES/C-R LEVEL 놉은 헤드폰이나 컨트롤룸으로 출력되는 신호의 레벨을 조절해 주는 녀석이다.
- TAPE RETURN TO
이 두 스위치는 테이프 리턴의 신호를 어디로 보내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스위치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메인 믹스로 테이프 리턴을 돌릴 경우 메인 믹스에는 나머지 신호는 전부 컷되고 테이프 신호만 출력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별 쓸 일은 없는 스위치들;;
- 레벨미터
마스터부 제일 상단 오른쪽에 보면 두 줄로 LED들이 나란히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맥키 24-4의 레벨 미터이다. 레벨 미터에는 평소에는 메인 믹스로 출력되는 신호의 레벨이 표시된다. 그리고 SOLO를 눌렀을 경우 현재 모니터되고 있는 신호의 레벨을 표시한다. SOLO 버튼이 하나라도 눌려져 있을 경우 RUDE SOLO LIGHT라는 붉은색 LED가 점멸하므로 쉽게 SOLO 상태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 LAMP
공연장의 환경이나 공연 내용에 따라서 완전히 불을 끄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오퍼레이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은 필요하다. 여기는 콘솔용 조명을 꽂아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이다. 12볼트가 출력되며, 구즈넥 타입의 BNC가 달린 램프를 쓰면 된다. 대규모 콘솔의 경우 4~8개, 그 이상 달린 녀석들도 있다. (하지만, 조그마한 스탠드 하나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마무리
이제까지 3회에 걸쳐서 오디오 믹서의 구조와 하는 일,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았다. 오디오 믹서는 음향 엔지니어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오래 조작할 핵심 장비다. 자신이 다룰 오디오 믹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에 대처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이니 아날로그니 하는 기반 기술과는 상관이 없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건 유연한 상황 대처를 위해, 그리고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 믹서에 대한 상세한 것을 파악하는 것은 엔지니어의 기본 역량이다.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쫄 필요는 없다. 본 필자와 함께 살펴본 것 처럼 결국 한가지만 잘 파악하면 나머지는 절로 딸려 나오게 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디오 믹서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이런 상황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웃보드(Outboard) 장비들이다. 다음 회차부터는 컴프레서(Compressor), 이퀄라이저(Equalizer), 이펙터(effector)들에 대해 알아보며 소릴 더욱 더 예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뱀발1
필자는 이 강좌를 HWP에서 작업한 다음에 HTML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는 정말 길었다.. A4 10포인트 기준으로 9장이 되어 버렸으니… 다음회 부터는 주변기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마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지 않을까 싶다. 여담이지만 3일 전부로 네이버에 이 홈페이지가 등록이 되었다. 이제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 (근데 오긴 오려나? ^^)나름대로 걱정이다 ^^ 여하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들 하셨고~ 다음시간에는 주변기기 첫째 시간으로 컴프레서/리미터/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뱀발2 – 디지털콘솔 시대의 GROUP과 AUX
디지털 콘솔이 보편화된 2024년 현재, 대부분의 기능들이 믹서에 통합되어 별도의 외장 이펙터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더하여, 디지털 콘솔은 대부분 많은 수의 출력 그룹 (믹스버스)를 가지고 있어, 모니터 역시 믹스버스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AUX의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아날로그 콘솔에서는 해당 개념이 유효하며, 디지털 콘솔에서의 모니터 및 이펙터 운영 방법 역시, AUX와 그룹을 운영 하는것과 개념적으로 완전히 동일 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2024
🔄 갱신 내역
- — 최초 게시
- — 1차 수정
- — 2차 수정
- — 블로그 이동, 3차 수정
이 글을 퍼 가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셔야 합니다.